지난 10여 년간 한국 콘텐츠 산업은
문화 영역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력 섹터로 성장했다.
글로벌 자본은 ‘확실한 성장 곡선’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된다.
투자자의 눈으로 본 콘텐츠 기업의
핵심 역량을 살펴본다.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 영역을 넘어 투자 업계의 뜨거운 섹터로 자리 잡았다. 모바일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가 성장 엔진 역할을 했고, 펄어비스(2017), 스튜디오드래곤(2017), 카카오게임즈(2020), HYBE(2020), 크래프톤(2021), 시프트업(2024) 등이 연달아 IPO에 성공했다.
특히 크래프톤은 한국 IPO1)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인 약 4조 3,000억 원의 공모 자금을 조달했고,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를 35조 7,000억 원으로 산정하며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창작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본시장 플레이어임을 보여준다. 성공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은 큰 수익을 거뒀지만, 기회를 놓친 투자사들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콘텐츠 산업은 이제 명실상부 투자 가치가 검증된 산업이다.

새로운 스타는 또 나올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 ‘Yes’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차 새로운 루키와 혁신적 제작·유통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
콘텐츠의 본질은 언제나 ‘품질’이지만, 흥행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빠른 제작 속도·정밀한 유통·데이터 기반 운영 역량이 결정적 경쟁력이 된다.
향후 콘텐츠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투자자는 이제 ‘히트작 한 편’보다 지속적 실험과 빠른 확장력을 통한 소비자에게 도달 능력을 중시하고 글로벌 자본은 ‘확실한 성장 곡선’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된다.
AI는 콘텐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OTT는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으로 시청자의 체류 시간과 결제 전환율을 높이고, 생성형 AI와 3D 엔진은 소규모 팀조차 글로벌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시장에서는 이미 ‘콘텐츠 생산성 S-커브’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오픈에이아이 소라(OpenAI Sora), 구글 베오2, 베오3(Google Veo2, Veo3), 런웨이 젠-3(Runway Gen-3), 루마 드림 머신 (Luma Dream Machine), 클링(Kling), 피카(Pika) 등은 영상 제작의 문턱을 낮추고, 신세시아·헤이젠·일레븐랩스(Synthesia·HeyGen·ElevenLabs)는 아바타와 오디오 영역을 혁신하고 있다. 언리얼(Unreal), 유니티(Unity), 엔비디아 에이스(NVIDIA ACE) 같은 실시간 엔진은 제작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미지 한 장으로도 리얼한 영상에 자연스러운 음향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베오3를 AI 영상 생성이 ‘무성 영화 시대를 벗어난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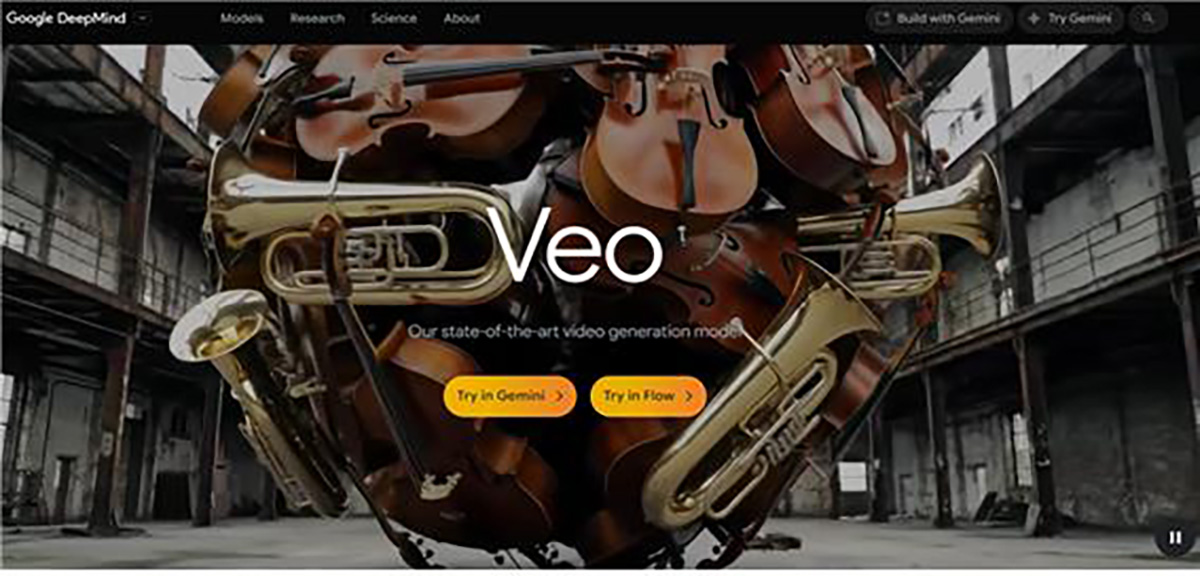 구글 베오3가 71개국에서 출시됨 Ⓒ구글 딥마인드 홈페이지(https://deepmind.google/models/veo)
구글 베오3가 71개국에서 출시됨 Ⓒ구글 딥마인드 홈페이지(https://deepmind.google/models/veo)
이 기술들이 결합하면, 콘텐츠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자산으로 변모한다. 동시에 유튜브(YouTube)와 틱톡샵(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와 커머스를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 기술·플랫폼·데이터가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콘텐츠 산업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미 넷플릭스·유튜브·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와 콘텐츠를 결합한 루키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곧바로 글로벌 진입 티켓을 확보한다. 투자자의 눈에는 이런 기업이 ‘작은 팀이 큰 시장을 흔드는 레버리지’로 비친다. 초기 단계에서의 과감한 투자가 의미 있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다.
AI 기반 툴은 개인 창작자의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장한다. 과거 자본과 장비가 있어야 가능했던 작업을 이제는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는 곧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다.
그러나 단순한 제작 툴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작물이 유통·수익화까지 이어지는 플랫폼 서비스가 병행돼야 한다. 유튜브 숏폼, 틱톡, 아프리카TV가 이미 일부 길을 열었지만, 앞으로는 AI 편집·더빙·이펙트·유통을 원스톱 제공하는 플랫폼이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다.
투자자는 이 지점에서 ‘개인의 창작 능력을 산업 차원의 역량으로 확장해 주는 플랫폼’을 주목한다. 이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다음 도약을 여는 핵심 투자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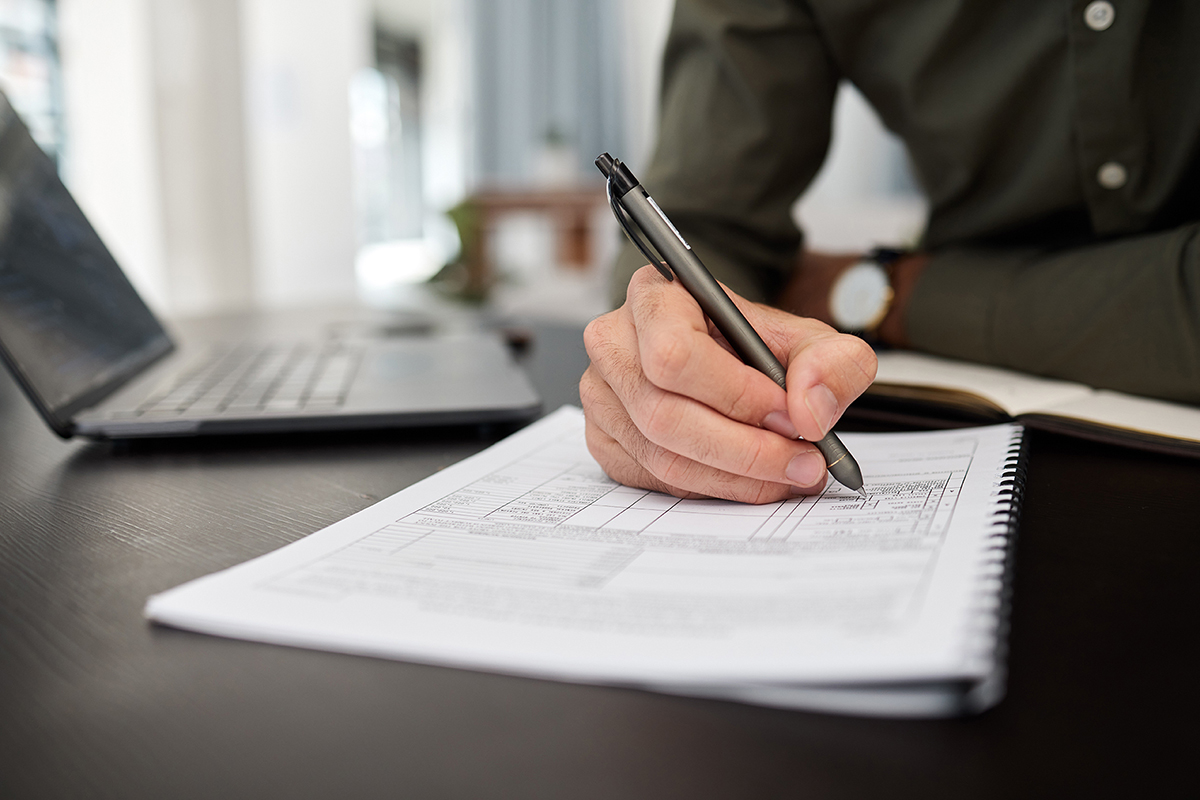
콘텐츠 기업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단순한 시장성 이상의 질문을 던진다. 향후 구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이 요소들은 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투자자의 기준이다. 체크 포인트 자체가 산업의 로드맵과도 일치한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미 K-게임, K-팝, K-드라마, 웹툰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은 단순한 성공 방정식의 반복이 아니라, 그 방정식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자의 눈으로 본 진정한 승자는 두 가지 가치를 아는 기업이다.
콘텐츠 종사자라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제 국내 자본을 넘어 글로벌 자본이 주목하는 무대에 섰다. 그 파도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기업과 투자자만이 다음 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일 수 있음을 믿으며,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의 만남을 환영한다.
윤소정 / KB인베스트먼트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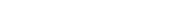

유현석(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T. 1566.1114 | www.kocca.kr
2025년 9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미래정책팀
플러스81스튜디오
<N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콘텐츠>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3022-0580(online)
Copyrigh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